"학문과 학문, 대학과 기업 경계 넘나드는 융복합 현상 더욱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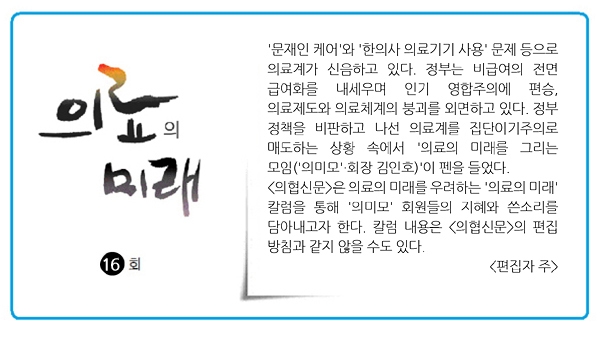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4400여 업체가 기술대결을 벌인 'CES 2019'의 키워드는 Mobile, AI, 5G, Intelligent Robot, Cooperation을 의미하는 'MAGIC'이었다.
필자의 모교인 고려대 의료원은 2달 전 비전선포식을 통해 향후 의료를 이끌어 갈 암정밀 진단 및 치료, 클라우드형 공유병원정보 시스템, 체액생검, AI기반 신약설계, 유전자 가위, 환자부착 칩, 3D장기 프린팅, 세포잉크, 착용용 소프트 로봇, 메모리 에디팅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까지 실감나지 않던 4차 산업시대의 신기술이 실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된 지도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의료계가 진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구, 혁신,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정립해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전형을 제시해야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만으로도 사회와 의료계의 관심을 전통적인 진료 영역에서 혁신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화로 전환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보면, 국내총생산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은 4.24%로 이스라엘의 4.25%에 이어 2위이다.
그러나 상업화 수준은 세계 43위로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 2007년 12.4%이던 교수 및 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창업이 지난해에는 8.3%로 감소했고, 2016년 전체 창업 87만 6414개 중 기술기반 창업은 8만 8234개로 약 10%정도이며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창업 0.1%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벤처스는 140개의 창업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은 기술이전료로 1410억 원, 스탠포드대학은 101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6년 산학협력실태 조사에 의하면 국내 425개 고등교육기관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761억 원으로 초라하며, 스탠포드 메디신이나 하버드 메디신의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인한 수입은 우리나라 초대형 병원의 의료부문 수익에서 얻은 이익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근본적 이유는 건당 기술 이전료의 액수가 한국 유수 대학의 건당 기술료는 5700만 원, 미국의 경우 16억 26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건당 기술료의 극심한 차이는 생명과학 분야의 비중이 낮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술이전에서 생명과학 분야의 비중이 한국의 경우 20∼30%, 미국의 경우 65%이고 액수로는 80%가 생명과학 분야이다. 생명과학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고 따라서 그만큼 부가가차치가 크기 때문에 기술 이전료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의약학계임은 말할 것이 없다. 의사는 바이오 의료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더욱 진전된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임상적 적용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근무처 자체가 기술개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의료의 저수가 정책은 이제 포기될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진료부문에서 최선을 다하고 병원경영에 있어 마른 수건도 짜낸다는 심정으로 노력해도 수익성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폐단은 평생 의사로 살아 온 필자뿐 아니라 의사라면 모두 공감하는바 이어서, 여기에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료계의 모순을 타개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도, 실험실의 벤치에서 실제 생활의 베드 사이드로 가치 이전이 이뤄져 국가의 경제 발전은 물론 의료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 가가 중요하다. 지식의 양과 축적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축적된 지식을 AI가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학도 기술이전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연구 초기부터 기술 멘토링·비즈니스 멘토링·사업화 멘토링 등 각 단계마다 세분화된 세련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학교나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기술 이전이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개업을 하는 의사들도 지역의 대학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진단과 치료 경험서 얻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 특화 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산병협력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과거 뜻있는 선배들이 맨땅에 헤딩하듯 우격다짐으로 창업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창업 환경이다.
물론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창업교수는 돈만 아는 속물이라는 선입견, 창업교수에 불리한 학내의 제도적 장치, SCI 등재에만 매몰돼 연구를 위한 연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성과제도 등이 그것이다. 창업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트브 제도 도입, 학교나 사회의 창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을 갈구하고 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건강과 안전에 대해 인류가 풀어야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숙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학문과 학문, 대학과 기업 등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인류 역사를 통해 언제나 인류를 위한 답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왔다.
국가의 근간을 구성하는 지성 집단으로서, 의료계가 갖고 있는 인적 우수성과 연구역량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인류에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우리 의료계가 한 단계 더 승화시키길 기대해 본다.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