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양 지음/도서출판 재남 펴냄/1만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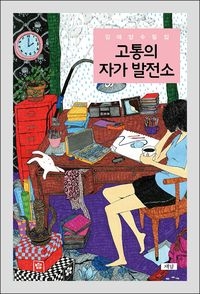
글의 힘은 읽히는 힘이다. 글에 마음을 빼앗기면 한 줄 한 줄 눈길을 내리다가 어느새 시선은 다음 쪽으로 옮겨가고 설렘을 머금은 손길은 이내 책장을 넘긴다. 뽐냄도 꾸밈도 없고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다. 그저 사는 이야기다. 그래서 더 가깝다.
수필가 김애양 원장(서울 강남·은혜산부인과의원)의 아홉 번째 작품집 <고통의 자가발전소>가 출간됐다.
그에게 글은 거울이자 저울이다.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삶을 달아보는 거울이다.
몇 번의 머뭇거림 속에서 시간이 조금 흘렀다. 가장 최근작인 <의사로 산다는 것 2>도 벌써 이태 전 일이다.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10년전 첫 수필집 <초대> 이후 해마다 책을 펴낸 그에게 주위의 채근이 이어진다.
그의 변명이다. "글자의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글을 쓰면서 세상과 소통한다. 밝은 곳, 아름다운 곳, 화려한 곳에 머물던 시선은 외롭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향하고, 우아한 현악기 선율처럼 현란한 소리에 사로잡혔던 영혼은 이제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불행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협하고 치우친 생각 속에 조화와 균형을 잃은 혼자만의 아집도 글 속에 스러져갔다.
'글자의 무게를 깨달은' 그의 글은 독자에겐 마음의 무게를 덜어준다. 사랑·배려·평안·위로를 품고 각박한 삶에 지쳐 냉랭해진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그의 이야기인데 내 부모, 형제, 벗이 어른거리고 지나온 시간이 새겨진다.
그의 선친은 영문학자 김재남 선생이다. 1964년 국내 최초로 세익스피어 작품 37개를 모두 완역했다. 평생을 세익스피어 연구에 몰두한 선친 슬하에서 그의 놀잇감은 책 뿐이었다. 그 역시 자연스레 문학에 대한 동경을 쌓아갔다. 4녀 1남 가운데 막내인 그는 대학입학을 앞두고 언니 셋과 오빠까지 의사이나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뜻을 선친께 내비쳤다. 그러나 선친은 한마디 말씀으로 여식이 뜻을 거둬들이게 했다.
"의사는 되기 쉬우나 문학을 전공하는 건 죽도록 어렵다."
김재남 선생은 세익스피어 완역 초판이후에도 1970년대와 1995년 두 차례 개정판을 냈다.
그의 말이다.
"선친은 늘 단어가 부족하다, 표현이 안 된다,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세익스피어가 사용한 영어 단어가 2만 1000개가 넘고, 그가 만든 신조어도 1800개나 된다면서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겠냐고 고심에 고심을 더하셨죠."
단어 하나에도 고심을 거듭했던 선친의 성정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졌을까. 소망했던 문학도반에서 비껴선 채 의사의 삶을 이어왔지만 그의 글은 쉽고 풍요롭고 깊이 있다. 단어 하나, 한 구절 한 문장도 섣부른 쓰임이 없고 더하거나 덜함 없이 정성으로 글을 짓고 소담스레 차려낸다. 읽기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을 마주하다보면 언제나 조탁을 거듭했을 글쓴이의 고뇌도 함께 배어든다.
'고통의 자가발전소'.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눠진 이 책은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진 그 집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 ▲고통의 자가발전소 ▲겁에 질려 죽은 남자 ▲어느 의사의 사랑앞에서 등을 표제로 쉰 세 편의 단상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걸리지도 않은 병을 염려하고 매사를 근심하며 사는 우리들, 마치 걱정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행복 메시지다. 스스로가 고통의 자가발전소에서 벗어나길 서원하는 소망 메시지다. 그리고, 이순에 이른 그가 보낸 세월만큼 가슴에 간직한 사랑 메시지다(☎ 070-8865-5562).


